찰칵, 일상 너머 이상을 찍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에서 만나는 다섯개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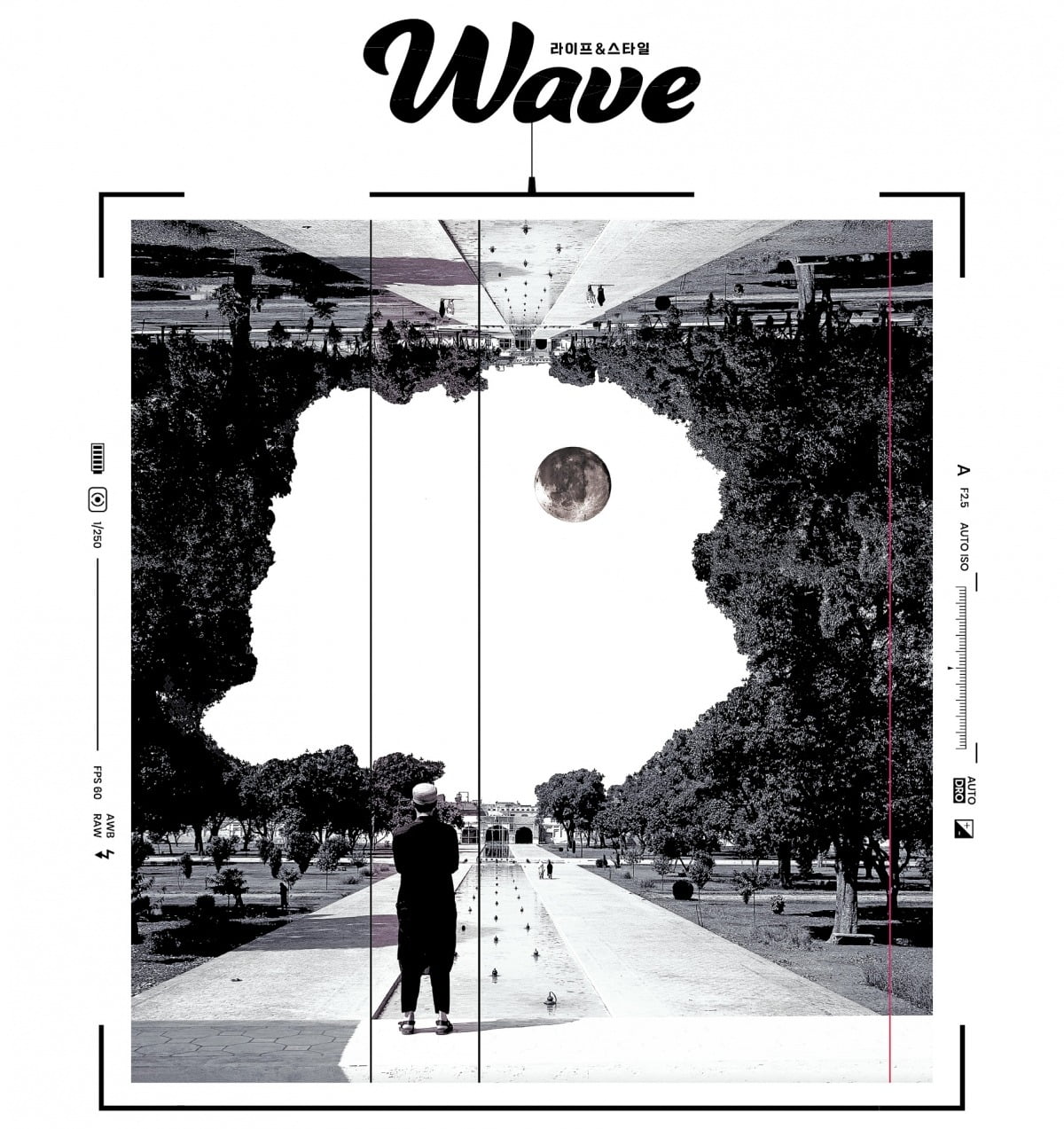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림을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었다. 프랑스에서 사진이 탄생한 이후 2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진은 미술의 영역에서 늘 논쟁적인 장르였다. 사진이 독자적인 예술로 인정받게 된 것은 한 세기가 채 되지 않았다. ‘사건을 기록하는’ 과학적 성취와는 별개로 기계의 힘으로 제작된 이미지는 예술적 허식을 품은 단순한 기술로 여겨졌고, 암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둠의 자식’으로 불렸다.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이 밝은 바깥으로 나가 찰나의 빛이 주는 아름다움을 담는 인상주의 회화를 탄생시킨 건 사진 예술에 대한 무의식적 반발이었을지도 모른다.
비록 프랑스 낭만주의 거장 보들레르가 “사진은 과학과 예술의 시녀”라고 격하하고,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모델 대신 값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며 예술의 보조도구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사진은 20세기를 거치며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과거 사진이 세상을 분류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오늘날 사진은 세계와 카메라 사이 존재하는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프랑스 사진가 수잔 라퐁의 말처럼 고전사진에서 현대사진을 넘어온 1970년대부터 카메라가 ‘개념을 시각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사진과 어둠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시들이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국제갤러리 ‘칸디다 회퍼 : 르네상스’, 뮤지엄한미 ‘밤 끝으로의 여행’, 성곡미술관 ‘프랑스 현대사진’, 리만 머핀 ‘알렉스 프레거’, 리안갤러리 ‘무한함의 끝’ 등이 그 주인공이다.
어떤 보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공간을 담아낸 극사실주의 사진, 과감하고 진취적인 도구들로 사진을 변형해 만들어낸 초현실적 사진,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사진에 인간의 손길이 덧칠된 하이브리드 사진까지. 봄의 끝자락에 열리는 사진전을 둘러보며 예술적 단상들을 나만의 뷰파인더에 담아볼 기회다.
유승목/안시욱 기자 [email protected]





![메타 하루 만에 5.8% 급등…AI 투자 낙관한 월가 [글로벌마켓 A/S]](https://koreacoinwiki.com/mir/t/560x0/photo/202407/B2024042507141393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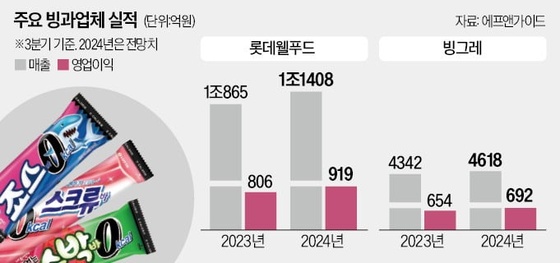
![[이 아침의 시인] 자유를 갈망한 저항시인…김수영](https://koreacoinwiki.com/mir/t/560x0/photo/202407/AA.3726884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