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메리츠스럽다'는 여의도 신조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편집국에서] '메리츠스럽다'는 여의도 신조어](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301/07.22164589.1.jpg)
요즘 여의도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잘나가는 메리츠증권을 빗댄 신조어다. 무슨 맥락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 잘 들어야 한다. 그때그때 의미가 다르다. ‘정말 잘한다, 부럽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도 되냐, 걱정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경험적으로 좋은 뜻과 나쁜 뜻이 미묘하게 섞여 있을 때가 많다.
메리츠증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됐다. 고금리에 짓눌린 여의도에서 나 홀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10년 전 변방의 중소형 증권사가 작년 위기 상황에서 1조원 수준의 이익을 거뒀다. 자기자본이 두 배 많은 부동의 1위 미래에셋증권의 아성도 넘을 기세다.
실질은 '부동산금융 사모펀드'
메리츠증권은 여타 증권사와는 많이 다르다. 주식 브로커리지 같은 리테일 사업이나 기업공개(IPO) 같은 전통적인 기업금융 업무에는 관심이 없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없다. 조직 자체가 거대한 사모펀드에 가깝다. 돈을 굴리는 게 주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권사에 부동산금융 지급보증이 허용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전략적으로 기업금융보다는 부동산금융에 특화했다. 과거 종금 라이선스를 활용해 돈을 싸게 조달한 뒤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순위 대출에 자금을 쏟아부었다.거의 모든 증권사가 메리츠의 길을 따라 걸었다. 금융당국은 2017년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불을 지폈다. 부동산금융의 장단기 격차를 활용한 ‘돈벌이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한 대형 증권사마저 3~4년 전부터 부동산금융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3조원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을 정도다. 아무도 저금리가 갑자기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시절이다. PF 선순위, 중·후순위, 브리지론뿐 아니라 심지어 토지매입계약금 대출에도 경쟁적으로 나서 PF 유동화증권이 47조원(작년 9월 말)까지 급증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자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진 배경이다.
위기 때 더 공격적 투자
돈이 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게 메리츠의 조직문화다. KH그룹 같은 코스닥 한계기업 관련 전환사채(CB) 돈줄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선 더 공격적으로 자금을 굴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이 발생해 증권사들이 대주주 주식담보대출을 회수하자 나 홀로 1100억원을 대주기도 했다.다들 부동산 PF에 물려 있을 때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두 자릿수 금리로 오른 PF 선순위시장을 독식하는 수준이다. 롯데그룹과 1조5000억원 펀드를 조성해 롯데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최고경영자(CEO)인 최희문 부회장 특유의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기민하게 돈을 잘 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경기 둔화 속 초대형 금융회사의 ‘베팅’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잖다. 메리츠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자기자본 대비 110%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CEO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 선순위 대출 중심인 메리츠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짜 위기 상황이 온다면 메리츠보다 더 위험한 대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먼저 문을 닫을 거라는 건 여의도의 불편한 진실이다.
![[편집국에서] 데이비드 스웬슨을 기리며](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105/07.26243005.3.jpg)
![[편집국에서] 유통 빅뱅…깨진 공식들](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104/07.19432074.3.jpg)


![메타 하루 만에 5.8% 급등…AI 투자 낙관한 월가 [글로벌마켓 A/S]](https://koreacoinwiki.com/mir/t/560x0/photo/202407/B2024042507141393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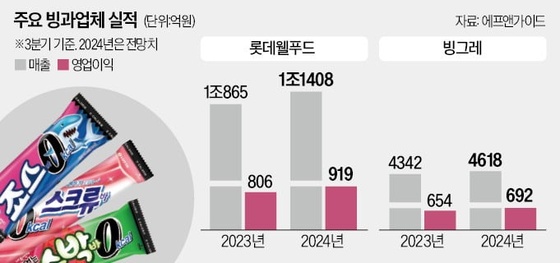
![[이 아침의 시인] 자유를 갈망한 저항시인…김수영](https://koreacoinwiki.com/mir/t/560x0/photo/202407/AA.37268842.3.jpg)